|
서울이야기 16 - 팔각정 1996년 남성 듀엣 화이트가 발표한 노래 “네모의 꿈”은 온통 ‘네모난 것’들로 가득 찬 ‘둥근 세상’을 꼬집었다. 이 노래는 건물에서부터 가구와 소품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물건들’ 수십가지 - 마음먹고 찾자면 수천 수만가지도 더 찾을 수 있을 테지만 - 를 나열한 후, 그것들이 ‘둥근 지구’ 위에 존재하는 부조리에 대해 언급한다. 물론 우리 주변의 사물이 주로 네모로 되어 있는 현상을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집이든 책이든 예전부터 네모였고(역사성), 네모로 된 것이 가장 낭비가 적으며(실용성), 길이를 조절해 가며 꾸미기에도 적합하다(장식성)고 생각한다. 물건을 만들 때 네모로 만드는 것은 그래서 때의 고금(古今)과 양(洋)의 동서를 막론하고 ‘당연한 것’, 따라서 그만큼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나는 이 노래의 작사자가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현상에 의문을 던진 데에는 ‘합리성 뒤에 숨은 근대적 획일성’ 전반을 회의(懷疑)의 대상으로 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근대적 시야(視野)에서 사각형은 가장 합리적인 도형이다. 이 도형은 분할과 합병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그 과정에서 버려지거나 남는 짜투리도 적다. 종횡으로 줄을 세워 관리하기도 편하고 면적을 계산하기도 쉽다. 굳이 자본주의적 경제법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각형만큼 유용하고 실리적인 도형은 없다.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 땅의 지식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온 포스트모더니즘이 비판한 것은 바로 이 근대적 ‘실용주의’였다. 예컨대 1950년대 구미(歐美)에서 유행하였던 포스트모던 건축은 ‘사각형 건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중세까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던 ‘형태와 의미’ 간의 상관 관계를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근대에 대한 회의가 전근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던 것이니, 포스트 모던 건축가들에게서 포스트 모던 post-modern과 프리 모던 pre-modern은 모던 modern을 건너 뛰어 연속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같은 건축적 시도는 한 때의 실험으로 끝난 것 처럼 보인다.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는 생각할 틈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바, 이 상황에서는 ‘실험’과 ‘시험’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할 일 없는 자들의 ‘한가한 짓거리’에 불과하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진보의 이미지가 각인된 것도 작금(昨今)의 상황이 이들을 ’소수자‘로 몰아간 탓일런지도 모르겠다. 소수자, 약자의 생각, 뜻, 바램이라면 그 내용과 관계 없이 진보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포스트모던 건축가들이 ‘형태와 의미’ 간의 연관성 회복을 통해 근대적 획일성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 그들은 ‘도형의 상징성’ - 실용성이 아니라 - 에 대한 전근대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에서는 중세 고딕 양식 건축의 첨탑에서 연상되는 삼각형이 피타고라스 이래 기본 도형 구실을 했던 것 같지만, - 피타고라스는 윤회설을 주장하는 등 인도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싯달타(석가모니)보다 20년쯤 일찍 태어났으니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피타고라스 학파의 윤회설이나 수학, 기하학이 인도 불교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다 - , 유교 문화권 내에서는 원(圓)과 방(方)의 두 도형이 모든 도형의 지위를 규제했다. 이른바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이라는 것인데, 원(圓)과 방(方)을 천지(天地)로 나누어 이해하는 이같은 도형관은 아마도 원시유교 단계, 혹은 그 이전에 정립되었던 듯 하다. 며칠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들 녀석이 늘 하던 식으로 느닷없는 질문을 던졌다. “아빠, 이 세상에 동그란 게 많게, 네모난 게 많게?” 녀석은 그 질문에 지체 없이 “동그란 거”라고 답하는 내가 좀 실망스러웠던 모양이다. “어떻게 알았어? 애들은 전부 네모난 거라고 하던데.” 다소 풀죽은 대답이 돌아온다. 의기양양해 할 거리 하나를 잃은 데 따른 당연한 반응이다. 주변의 다른 아이들이 ‘세상’을 문자 그대로 ‘지표상’에 국한한 반면 녀석은 그것을 ‘전우주’로 확대했고, 그에 따라 무수한 ‘별들’이 동그라미 집단에 가세했다. 물론 내 아들 녀석은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산만한 독서의 결과로 얻은 잡다한 지식으로나마 - 애석하게도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은 하늘을 직접 관찰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 땅 위에는 네모난 게 많고 하늘 위에는 온통 동그란 것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認知)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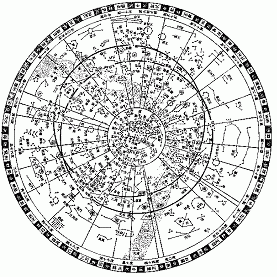 고구려 천문도를 1395년에 복제한 그림이다. 고구려 천문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천체와 천계의 모양, 천체의 운행궤적이 모두 원으로 그려져 있다. “하늘은 둥글다”는 사실은 이 때 이미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덤으로 얻은 소득은 자유롭게 하늘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었다. 더구나 인간은 등을 땅에 대고 눈은 하늘을 향한 채 잠자는 습성을 키워 왔다. 그런 만큼 인간은 그 ‘종적(種的) 출현’과 동시에 하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관심이 형상에 대한 탐구와 그 상징성의 추적, 나아가 포괄적인 숭배로까지 확산된 것이 언제부터인지를 단정짓기는 곤란하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천기(天氣)의 중요성이 제고된 탓인지 - 단군신화에도 천신(天神)의 아들 환웅(桓雄)의 수행원 상좌(上座)는 바람, 구름, 비를 관장하는 자들이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 아니면 “청동기 시대 외계 충격” - 런던에 본부를 둔 학제간학회의 1997년 연차대회의 주제였다. 이 대회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운석 강하, 공중 폭발 등 장기간의 외계 충격이 계속 되어 인간이 하늘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하늘에 신(神)이 있다는 보편적 관념이 등장했다는 이론이 제출되었다 -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어간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하늘은 “신(神)의 공간”이요 “하늘 나라”로서 지표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세상’을 구성하였다. 이제 신이 인간을 징벌하는 도구는 번개, 비, 태풍 등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구성되었으며 - 그리스의 다신교 체계에서도 최고의 신은 태양신(아폴론)이나 달의 신(아르테미스)이 아니라 번개의 신(제우스)이다. 오늘날까지도 신의 징벌에 대한 공포는 종교의 핵심 요소를 이루고 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큼 종교의 벌거벗은 본질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도 찾기 어렵다 - , 그 이전까지 신성(神性)을 담지하였던 맹수의 이빨, 풀의 독과 같은 것은 잡귀(雜鬼)나 마귀(魔鬼)의 ‘수단’으로 격하되었다.  첨성대. 장방형의 돌을 원형으로 쌓아 올려 가다가 창구와 정상부는 사각형으로 처리했다. 이 건조물이 천문관측용인지 제의용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당대인들이 원형과 방형을 상호 구별되는‘특수한 도형’으로 생각한 것만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신의 공간’을 관찰하면서 천체(天體)가 둥글 뿐 아니라 그 운행(運行) 역시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의 세상’은 온통 둥근 것으로 이루어졌다 ! 신의 세상이 둥글다면 인간의 세상은 그와는 달라야 했다. 하늘에서 신(神)이 탄생한 그 무렵에, 인간이 사는 집들은 부정형이나 타원형에서 방형(方形)으로 바뀌어 갔다. 오늘날에도 몽골 초원이나 알래스카 설원, 아프리카 사막 지대에 샤는 사람들은 원형(圓形)으로 집을 짓기도 하지만, 범인류적 관점에서 보자면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 앞서 편의적으로 유교 문화권의 세계관이 천원지방설이라고 했지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는 생각은 유교보다도 먼저 나왔던 것이다.  종묘 악공청. 악공청 기둥은 사각, 팔각, 16각, 원 등 여러 종류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지간의 소리를 담아 조화시키는 것이 곧 음악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탓이다. 하늘과 땅이 각각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로 구분되고, 그 사이에 상하의 엄격한 위계가 설정되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의 가치도 그 위계 속에 자리매김되었다. 유교의 사농공상(士農工商) 직역관(職役觀)은 하늘과 땅,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대적 사고를 중세의 세련성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하늘의 도리를 이해하고 하늘의 일을 대신 행하는 자 - 무(巫), 사제(司祭), 승(僧), 사(士) - 가 수위(首位)요, 그 다음은 땅에서 곡식을 심고 가꾸며 수확하는 자 - 농(農) - 이고, 천지(天地)의 작용 없이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자 - 공(工) - 가 그 아래이다. 그 자신은 세상 만물에 아무것도 추가하는 것이 없으나 유무상통(有無相通)하여 천지인(天地人) 각각이 만들어낸 만물을 천하에 고루 통용시키는 자가 최하위의 상(商)이다 - 조선 후기 화폐인 상평통보(常平通寶)는 원형과 방형을 같이 사용하여 천지간에 유통하는 보물(寶物)이라는 뜻을 담았다 -. 그밖에 세상에 아무 실익도 주지 못하여 하늘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을 비익(裨益)하지 못하는 자들은 천(賤)이며, 호생지덕(好生之德)에 반(反)하여 죽임으로써 업을 삼는 자 = 백정(白丁), 도축업자는 천지천(賤之賤)이다. 사람의 직역에만 위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도형과 도형 사이에도 위계가 설정되었다. 하늘의 원(圓)은 신(神)의 도형이요 땅의 방(方)은 사람의 도형이 되었다. 신과 소통하기 위한 건조물의 경우에는 - 신(神)을 위한 건조물이 아니라 - 사람과 신이 만나는 ‘형태의 의미’를 담는 도형을 선택했다. 잘 알려진 첨성대는 한 건조물에 원형과 방형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중간 도형의 의미를 담았는데, 그보다는 팔각(八角) 도형이 더 자주 사용되었다. 사각의 네 귀퉁이를 자르면 팔각이 되고, 다시 그 여덟 귀퉁이를 자르면 16각이 된다. 이렇게 32, 74각으로 깎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원이 되는 것인데, 그 탓에 팔각은 방형과 원형의 중간 도형으로 해석되었다. 종묘의 몇 안되는 부속 건물 중 하나인 악공청(樂工廳)은 원형 대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 기둥 모양의 의미만은 그대로 전하고 있다. 악공청 기둥은 사각에서 원에 이르는 여러 도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악(樂)은 천하를 측량하는 기준 - 사물의 크기나 두께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은 눈보다 귀가 뛰어나다. 같은 소리를 내는 피리는 재질이 같다면 길이와 두께, 대롱의 크기도 같다. 그 탓에 고대 중국에서는 피리를 도량형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를 황종척(黃鍾尺)이라 했다. 피리의 길이가 척(尺)의 기준이 되며, 그 무게가 관(貫)의 기준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장[黍]의 부피가 두(斗)의 기준이 된다. 조선초 세종(世宗)이 박연(朴堧)을 시켜 음악(音樂)을 정비케 한 것은 기실 도량형(度量衡) 정비에 궁극적 목적이 있었다 - 인 동시에 천지간 만물의 소리를 표현하고 조화시키는 틀이었다. 따라서 여러 모양의 악공청 기둥은 천상부터 지하까지 여러 계단의 음을 조율(調律)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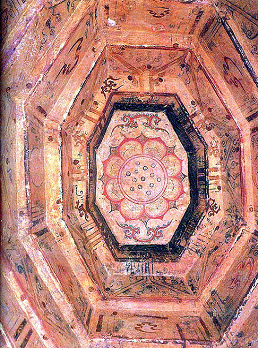 고구려 덕화리 1호분 널방 천정의 벽화. 이 벽화에는 북두칠성을 포함한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데, 널방 천정은 팔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각형을 사각형과 원의 중간 도형으로 취급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천문도를 그린 고구려 고분에 팔각 도형을 사용한 것이 있으며, 고구려 사찰에도 팔각탑이 채용된 사례가 있었다. 아마도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은 지역이나 종족 단위의 우주관이 아니라 천문학(天文學)을 만들어낼 능력을 갖춘 인간 집단이 일반적으로 공유한 우주관었을 게다. 인도 불교에서도 - 불교에서도 부처의 세계를 원융(圓融)으로 설정했으니 팔방 팔대명왕설 역시 천원지방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중국 유교에서도, 고구려의 독자적 종교에서도 팔각은 모두 특별한 의미, 즉 하늘과 땅을 잇는 도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설혹 팔각 형태에 대한 의미부여가 각각 달랐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종교적 의식이 존재한 이상, 팔각에 대한 서로 다른 의미 부여는 결국 하나로 융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월정사팔각구층석탑. 팔각 도형은 삼국 중 고구려에서 특히 많이 사용했는데, 고려 건국 이후 소생한 고구려 문화 요소 중 대표적인 것이 팔각탑이다. 통일신라와 고려의 건조물에도 팔각이 가끔 채용되었는데, 이 도형에 천지(天地)를 잇는 신성성(神聖性)의 이미지가 이미 깊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불탑(佛塔)과 같은 종교적 건조물이 아니고서는 감히 쓸 수 없었다. 다만 이 때까지는 중국과는 다른 천하(天下)를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형 건물이나 팔각 건물을 짓는 것이 금제(禁制)가 된 것은 아니었다. 고려에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단(天壇) = 원구단(圓丘壇)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 중심의 천하관(天下觀)을 받아 들이고,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중국 천자(天子)의 독점적 권리를 승인한 이후로는, 원형이나 팔각 건조물은 제후국에서 지을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세조 때 일시적으로 제천의례를 부활시키고 원구단(圓丘壇)을 지은 적이 있지만, 주자성리학이 왕의 통치 이념이자 민의 생활 윤리로 정착하면서부터 명분에 어긋나는 참월(僭越)한 건축물은 더 이상 지을 수 없었다.  창경궁에 있는 성종대왕 태실. 팔각 기단에 팔각으로 울타리를 둘렀으며 난간 역시 팔각이다. 조선 중엽 이후로 원형은 왕의 무덤에나 쓸 수 있는 도형이 되었고 - 범부(凡夫) 범부(凡婦)도 죽으면 학생(學生)이 되고 유인(孺人)이 되는데, 왕이 죽으면 신격(神格)을 얻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 팔각형은 죽은 왕의 태실(胎室)이나 건조물의 외곽 장식부위인 난간에나 쓸 수 있는 도형이 되었다 - 난간은 건조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기는 하되 어쨌든 지표에서는 떨어져 있으니 하늘과 땅의 중간에 존재하는 물체로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 -. 건물의 기둥 조차도 왕궁이나 사찰, 종묘 사직 등 신성한 건물이 아니고서는 원형을 쓸 수 없었다. 현재 경복궁과 창경궁에는 풍기대(風旗臺)라는 것이 남아 있다. 18세기에 조성된 이 구조물은 사각 기단에 팔각 깃대를 세우고 그 위에 원형의 깃봉을 꼽게 되어 있다. 사상적, 종교적 관점에서는 다보탑과 전혀 다른 구조물이지만 형태의미론적 관점에서는 완전히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더 말하면 잔소리다. 모든 도형이 단순한 디자인 요소로 전락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팔각은 하늘 자체는 아니로되 하늘과 땅 사이에 게재하여 그 둘을 매개하는 - 달리 말하면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는 - 도형이었다.  다보탑. 기단부와 1층은 사각 2층은 팔각, 옥개석 위의 상륜부는 원형이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자 사바세계에서 원융세계로 이행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1897년 10월,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원(圓)과 팔각 사용에 대한 금제(禁制)도 풀렸다. 칭제건원(稱帝建元)에 앞서 경운궁 정면, 전 남별궁 터에 원형 건물 원구단이 건립되었다. 다 아다시피 원구단(圓丘壇)은 곧 천단(天壇)이다. 천자(天子)가 하늘과 직접 소통(疏通)하는 장소이니 그 자체가 하늘이었다. 고종은 이 곳에서 황제로 즉위한 지 2년 후 그 옆에 다시 팔각 황궁우(皇穹宇)를 지었다. 황궁우(皇穹宇)에는 천신(天神)과 지신(地神), 인신(人神) = 태조의 신위를 모셨다. 이 건물은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것이었기에 온통 팔각으로 만들어졌다. 건물 모양도 팔각이고 건물 기둥도 팔각이며 건물을 둘러싼 난간석도 팔각이다. 원구단과 황궁우는 대한제국이 천자국(天子國)임을 상징하는 건조물이었고, 이 두 건물이 들어선 장소는 이 나라에서 가장 존엄하고 신성한 곳이었다.  창경궁 풍기대, 기단은 사각. 깃대는 팔각, 그 위의 깃봉은 원형을 이루고 있다. 다보탑과 완전히 같은 형태의미소를 담고 있는 조형물이다.  원구단과 황궁우. 원형과 팔각형 건조물이 나란히 서있던 이곳은 대한제국기에는 이 땅에서 가장 신성하고 존엄한 곳이었다. 그런데 황궁우를 지은 지 다시 2년 후에 종로 탑골공원 한 복판에 팔각정이 들어섰다. 탑골공원의 건립 이유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나는 1896년 9월 내부령으로 공포된 “한성내 도로의 폭을 개정하는 건”을 계기로 급진전 된 가가 철거, 도로 개수, 도시 개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본래 도시공원(公園)은 산업혁명 이후 도시 노동자의 급증으로 인한 도시 환경 및 경관의 총체적 악화를 배경으로 출현한 공공시설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조차 이 시설이 출현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1890년대 중반의 서울은 공원을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 시점에, 매일같이 인파로 뒤덮이던 운종가(雲從街) 동쪽 끝자락, 옛 원각사, 연방원(聯芳院), 한성부로 쓰이다가 당시에는 민가로 빽빽히 둘러싸인 쓸모 없는 공간으로 남아 있던 곳에 공원을 만든 것은 실용성보다는 상징성을 먼저 고려한 때문이었다. 영국인 총세무사 맥레비 브라운(McLeavy Brown)이 어떤 의도로 공원 조성을 건의했든 간에, 고종은 이 공원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다. 공원은 황실의 정원(Garden)은 아니었다. 고종이 시정 잡배들로 우글거리는 민(民)의 거리 - 운종가(雲從街) - 에, 민(民)의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은 영조가 준천(濬川)을 할 때에도, 정조가 ‘통공(通共)’을 할 때에도 되풀이 밝혔던 ‘위민(爲民)의 왕정(王政)’을 계승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탑골공원 조성 전의 원각사지. 원각사지 십층석탑 주위로 초가 지방이 조밀하게 늘어서 있다. 이 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가의 점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집을 사들이는 조치가 필요했다. 당시만 해도 불법 건축물이라 해서 마구잡이로 허는 일이 용납되지는 않았다. 민(民)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최후의 의지처는 어쨌든 국(國)이요 군주(君主)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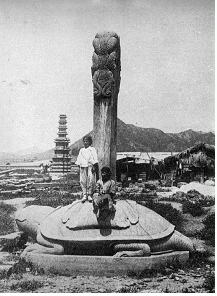 탑골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되던 무렵의 원각사지. 공원은 황제가 ‘만들어 준’ 공간이었으되, 만들어지자마자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적 담보로 기능하였다. 공원이 만들어진 직후인 1898년, 시민사회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가 당장 이 곳에서 열렸다. 도시 내에 공식적인 ‘민(民)의 자리’가 지정되었고, 민(民)은 자신의 요구와 주장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거점을 얻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민(民)이 왕(王)과 만나는 장소들은 있었다. 영조는 능행이나 종묘 행차 때면 혜정교(惠政橋) 앞이나 수표교변, 종묘 동구 등에 잠시 어가(御駕)를 멈추고 시민 = 공시인(貢市人)들을 불러 무슨 어려운 일이나 없는지를 묻곤 했다. 이는 이윽고 ‘공시인순막(貢市人詢瘼)’이라는 이름의 관행적 제도가 되었는데, 이 행위에도 역시 ‘이민위천(以民爲天)’의 사고(思考)가 담겨 있었다. 그러니 고종의 시각으로 보자면, 공원의 조성은 민심(民心) = 천심(天心)을 읽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그는 만민공동회의 헌의육조(獻議六條)를 가납(嘉納)하면서 아마도 선왕(先王)대의 관례를 떠올렸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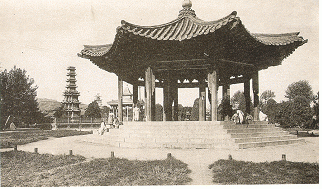 탑골공원에 들어선 팔각정. 1902년 “고종황제 어극(御極) 40년, 망육순(望六旬) 칭경(稱慶) 기념 대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탑골공원 한복판에 팔각정이 만들어졌다. 이 건물을 지은 도편수 최백현은 지금 교보빌딩 앞에 있는 “기념비전”을 지은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원형의 원구단(圓丘壇)과 팔각형의 황궁우(皇穹宇)는 제국(帝國)과 황권(皇權)의 상징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탑골공원 한복판에 들어선 팔각정(八角亭)은 다름 아닌 ‘황제가 인정한 민권(民權)’의 상징이었다. 민심(民心)은 곧 천심(天心)이니 이 건물은 황제기 언제나 하늘의 뜻을 향해 이목(耳目)을 기울이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건물은 그래서 민국(民國) - 이태진 교수에 따르면 이 말은 “나라의 주인은 민(民)과 왕(王)이라는 뜻이다 - 이념의 구현물이라 해야 마땅한 것이었다. 1919년 3ㆍ1운동이 이 곳을 거점으로 해서 시작된 것도 당시 사람들이 이 장소, 이 건물에서 느낀 ‘아우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남산의 이승만동상. 유사 이래로 신(神)이 되고자 한 사람들을 이루 다 헤아릴 수는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이 된 사람은 결코 없다는 사실이다. 산 자를 신격화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엄청난 부작용만을 남기고 끝났다. 김일성을 저 세상으로 보내지 못하고 ‘유훈통치’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 상황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광복 후 1959년, 남산 옛 국사당 자리에 다시 팔각 정자가 세워졌다. 정자의 이름은 당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의 호를 따서 ‘우남정(雩南亭)’이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1956년, 탑골공원과 남산 옛 조선신궁 자리에는 이승만의 동상이 섰다. 당시 동상과 정자의 입지를 선택한 사람들은 분명 탑골공원과 팔각정이 지닌 장소와 건조물의 신성한 아우라를 이승만에게 갖다 대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대한제국기를 ‘민권운동’으로 보냈던 이승만 역시 그 상징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테고. 그러나 벤야민(Walter Benjamin)이 말한 바와 같이, 건축가가 건축물에 부여하는 이미지와 사람들이 그로부터 얻는 의미는 별개이다. 설계자와 건축가는 팔각정의 아우라를 이승만에게 덧씌우고자 했지만, 사태는 오히려 팔각 도형의 세속화(世俗化)로 귀결되었다.  남산 우남정 앞의 이승만. 팔각정에 자기 아호를 붙인 것이 ‘빨리 죽어 귀신이 되라’는 뜻일 수도 있음을 알기는 했을까. 남산 정상의 팔각 정자에 ‘우남정(雩南亭)’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승만을 신격화하고자 했던 탓인지, 이승만은 그 바로 얼마 후 ‘산 귀신’ - 하야(下野) 후의 이승만은 살아 있으되 죽은 것이나 다름 없는 존재였으니 ‘산 귀신’이라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 이 되었다. 4ㆍ19 이후 시민들은 탑골공원과 남산의 이승만 동상을 쓰러뜨리고 새끼줄에 묶어 끌고 다니면서 조작된 ‘신성(神性)’을 모욕했다. 그러나 우남정은 불태우는 대신에 이름만 바꿈으로써 그 건물에 부착된 이승만의 이미지를 지워버리는 것으로 그쳤다. 더불어 형태와 의미간의 오래된 관계도 단절되었다. 그 얼마 후부터 북악 스카이 웨이를 비롯한 서울 곳곳, 나아가 지방 도처에 ‘신성의 아우라’가 완전히 소멸된 팔각정자들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금도 강변 야트막한 구릉지에 계속 지어지고 있는 팔각정에서 ‘신성성(神聖性)’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없다. |
- BoardLang.text_prev_post
- [서울이야기] 복수의 하나님
- 2006.03.28
- BoardLang.text_next_post
- [서울이야기] 종로, 전차(1)
- 2006.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