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학사 책’에서 실종된 윤리 하일식(고대사분과, 연세대 교수) 몇 달째 떠들썩하던 ‘교과서 논란’이 잦아드는 분위기다. 미결정 상태도 많지만, 교학사 책을 채택한 학교가 거의 없다고 한다. 교육계에 상식과 이성이 아직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교육부가 애초부터 이 책을 비호하고, 집권세력이 그토록 두둔한 까닭을 이해 못한다. 채택을 시도한 일부 학교의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애초부터 혼란스러웠다. 교학사 필진은 새누리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했다”고 한 뒤 근거를 묻자 대답하지 못했다. 오래전에 어떤 극우 인사는 전교조가 이렇게 가르친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이는 2005년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의 창립선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비이성적 주장도 반복해서 접하면 확신하게 된다. 그것이 대중에게 퍼져서 사회적 광기로 확대되어 큰 희생을 치른 역사가 있다. 히틀러의 독일이 그랬고, 천황제 파시즘의 일본이 그랬다. 독일처럼 늦게나마 반성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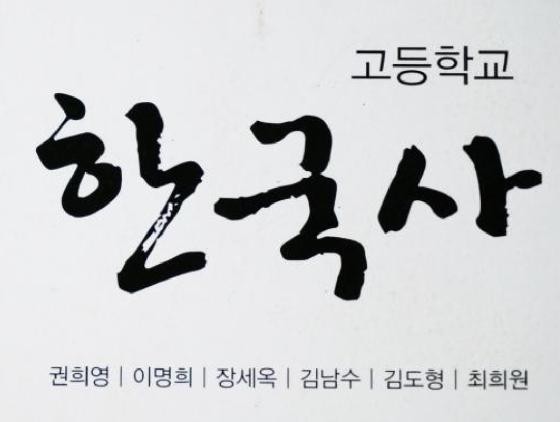 교학사 필진이 주장한 것이 ‘긍정사관’이었다. 그러나 과거의 온갖 것을 긍정하려고 역사를 배우지는 않는다. 역사를 돌아보는 으뜸 이유가 성찰임은 고금의 명제이다. 일본에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는 것도 성찰을 통해 불행을 되풀이 말라는 것이다. 극단 세력은 곧잘 애국심을 들먹인다. 그러나 남녀 사이에서도 비정상적 집착과 사랑은 구별된다. 전자가 흔히 폭력이 동반되는 불행으로 끝나기 십상임을 의사가 아니어도 안다. 하물며 국가와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교과서는 어떤 사관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다. 기존 교과서를 ‘좌편향’이라 비난하는 이들은 스스로 특이한 가치관에 집착한 탓에 기존 교과서가 입맛에 맞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교과서는 학계의 연구를 수용하여 통설에 따라 서술된 내용이다. 그들은 또 “학계의 대부분을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증적·합리적인 절대다수 학자들과 교사들을 비난하기 일쑤이다. 과연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 교과서는 기초적 사실을 정확히 담아야 한다. 이는 미덕이 아니라 기본이다. 학계는 교학사 책의 숱한 오류와 착란을 몇 번 지적했다. 다른 교과서와 비교 불가한 엄청난 건수였다. 교육부의 비호를 받아 수정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오류를 빚은 경우도 흔했다.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 사실조차 정확히 담지 못한 책이 내세운 사관인들 오죽하려니!”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식이 있는 국민 대다수가 그러지 않았을까? 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학사 책 채택을 철회하도록 항의한 바탕에 이런 이유도 있으리라 본다. 무엇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지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금방 눈치채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활용된 사진이나 글의 저작권은 사후 처리된다. 단 유물 유적의 사진이나 국어 책에 넣은 문학 작품 등에 해당되며, 역사 교과서 문장을 아무 데서나 베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검정 기준에도 표절 여부가 들어 있다. 교학사 책의 베끼기는 가히 기록적이었다. 문화재 안내판, 뉴라이트 서적, 역사교사모임의 책, 시중의 교양서적에서 토씨까지 그대로 옮긴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다. 위키백과나 블로그, 교회 게시판 등 신뢰하기 어려운 것들도 수두룩했다.  나는 대학생 과제물에도 “관련 논문과 저서를 소화하여 자신의 언어로 풀어 정리하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나는 교학사 책이 최소한의 규범·윤리조차 무시한 것에 경악했다.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고치거나 빼면 된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남의 집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다가 들켜 길에 버리면 끝나는가? 출판사를 바꾸지 않을까 추정한 보도도 나왔지만, 그래도 필진은 남을 것이다. 또한 지적받고 수정하며 베낀 흔적을 없애도 그 과정에 대한 다수의 기억을 지우지는 못한다. 교학사 책은 글쓰기의 기본 윤리를 팽개치고 ‘막무가내 집필’되었다. 독자가 외면하고 기피할 으뜸 요소이다. 그러나 ‘묻지 마 채택’을 시도한 교육계 일부 인사들에게는 이 점이 안중에 없었다. 그러면서 학생에게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교학사 책 논란에서 이 점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느낌이다. *본 글은 <한겨레신문> 2014년 1월 21일자에 실었던 것입니다. |
- BoardLang.text_prev_post
- 나는 요령을 피우고 싶었나 보다(제4회 한국사교실 참여 후기)
- 2014.03.25
- BoardLang.text_next_post
- 교과서와 역사교육에 대한 원로학자 회견문
- 2013.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