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ea와 Korea, 그리고 남과 북 정 용 욱 미국에는 'Corea'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두 개 있다. 하나는 메인(Maine)주 북동부 해안지방에 있고, 다른 하나는 조지아(Georgia)주 남부에 있다. 이 도시들의 이름이 한국과 어떤 인연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같지는 않다. 미국의 지명들은 대체로 백인들이 정착하면서 붙인 이름이거나 아니면 원주민인 아메리칸 인디언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 경우는 주변 지명들에 인디언식 호칭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인디언식 지명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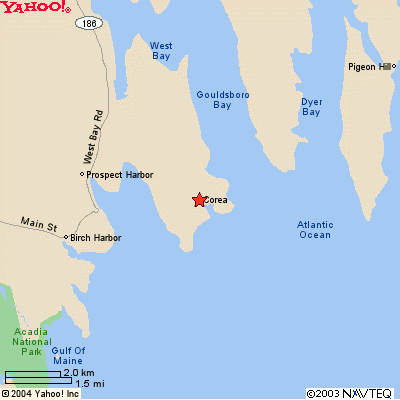 이 도시들의 이름을 알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작년 여름 평양에서 개최한 "국호영문표기를 바로잡기 위한 남북학술토론회"에 참가했을 때 북측 발표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했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한 젊은 연구자가 혹시 미국에 'Corea'라는 지명이 있는지 필자에게 확인해주기를 부탁했던 것이다. 이 부탁을 받자 호기심이 일어서 어떻게 미국에 그런 지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되물었다. 그는 그것을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 있는 일제 식민지기에 나온 한 영어 학습문제지에서 보았다고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原仙이라는 일본인이 지은 "和英標準問題精講"이라는 책의 문제풀이에서 미국에 Corea라는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문 표기가 Corea에서 Korea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보았다는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뒤 이 책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직 찾지 못하였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할 때 큰 역할을 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의 글이 실려 있는 "日韓倂合紀念史(辭?)"(1912)라는 책에도 영문 국호 표기와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나 이 책 역시 아직 찾지 못하였다. 혹시라도 이 책들의 소재를 알고 있는 분은 꼬-옥 연락주기 바란다. 남과 북의 학문 교류가 자유로워지면 전혀 들일 필요가 없는 노력을 그와 필자는 이 좁은 땅덩이 위에서 이중으로 하고 있다. 남의 학자들, 특히 미국에 여행이라도 한 번 갔다온 적이 있는 이들에게 'Corea'라는 지명을 찾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만큼 쉬운 일이다. 느긋한 기분으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미국의 야후닷컴(www.yahoo.com)에 접속한 뒤 맵퀘스트(Map Quset)에서 자판에 'c-o-r-e-a'를 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인터넷으로 남한의 주요 도서관들을 뒤져보았지만 "和英標準問題精講"과 "日韓倂合紀念史"를 아직 찾지 못했다. 일본의 도서관들을 뒤지면 나올지 모르겠으나 "和英標準問題精講"이라는 문제집은 일본 도서관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필자는 북의 젊은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는 내심 놀랍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 가슴 한켠이 아릿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북 사람들을 만나면 3,000만 권이나 되는 인민대학습당의 장서량을 자랑삼아 말하고, 그곳에는 "和英標準問題精講"이 남아 있지만 이남의 웬만한 가정에서 1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미국의 지명 찾기를 그곳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자신에게 주어진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 식민지기에 나온 영어문제집까지 뒤져가며 주제를 파고드는 연구자를 이곳에서는 본 적이 없다. 연구자들이라면 자료와 숨바꼭질이 주는 피 말리는 긴장감을 잘 알 것이다. 이 젊은 연구자가 열악한 연구환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 헤매며 들인 노력과 정신적 긴장을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진다. 그러나 "和英標準問題精講"에 나온 설명은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믿거나 말거나 식의 설명이다. 필자가 야후닷컴에 의지해 'Korea'를 검색한 결과 미국에는 Korea라는 지명을 가진 소도시가 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에 각각 한 군데씩 있고, 푸에르토리코에도 한 군데가 있다. 'Korea'라는 지명 역시 미국에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같은 지명이 있어서 Corea를 Korea로 바꾸었다는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70여 년 전에 나온 영어문제집의 문제풀이까지 검토하는 철저한 자세는 높이 사줄 만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별로 검증할 가치가 없는 자료를 무시하지 못하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Corea에서 Korea로의 영문 국호 명칭 변화는 지금 시점에서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의구심을 자극했던 모양이다. 1930년대 중반에 미국에 거주하던 한 한국인이 미국 국무부에 Corea에서 Korea로 바뀐 경위를 질문했고, 미국 국무부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단편적 사실들을 확인한 채 별 뾰족한 답변을 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영문 국호의 변천 경위에 대한 학계 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지만 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대단히 높다. 2002년 월드컵 개최 당시 개최국 명칭 표기 순서를 'Korea-Japan'으로 한국을 앞에 놓는 대신 결승전 개최지를 일본에 넘겨줬다는 소문도 있지만 어쨌든 2002년 월드컵 당시 '오- 필승 코리아'라는 응원구호에서 코리아는 한결같이 'Corea'로 표기되었다. 또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뒤 Corea가 알파벳 순서 상 Japan 앞에 오는 것을 꺼려해서 일제가 Corea를 Korea로 바꾸었다는 통속적인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본격적인 연구는 부진한 편이지만 대체로 논의 지형은 이 문제가 일제 침략의 증거라는 주장과 민족주의의 과잉 표출이라는 주장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연구의 논점도 일제의 동향에서 명칭 변경의 구체적 계기를 찾아내려는 데 집중되어 있다. 전자의 주장은 명칭 변경에 일제의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것이고, 후자의 주장은 일제 강점을 전후해서 Korea가 관용적으로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을 뿐이지 일제의 의도나 음모가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후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19세기 말 이전 영어권 국가에서는 한반도를 호칭할 때 특별히 정해진 원칙 없이 Corea와 Korea를 모두 병용했고, 이러한 교차 병용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가적인 정책이나 강요 때문이기보다는 영어의 언어적 특성 때문이고, 영어권 국가에서 '고려'를 자국음으로 표기하려는 노력이 나타나면서 Korea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고려'를 음차한 코리아의 영어 표기는 Corea나 Korea 어느 쪽이나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또 개항기에 조선왕조가 서구 열강이나 일본, 청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조약문에는 'Corea-Chosun'을 사용했지만, 대한제국기에 들어서는 Korea를 사용한 용례도 발견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태는 한층 복잡해진다. 하지만 후자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1890년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영문 호칭은 Corea가 압도적이었는데 1890년에서 1910년 사이에 Korea가 점차 늘기 시작하더니 1910년 이후 Korea 일색으로 된 사정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영어의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C와 K의 병용이 가능했다면 왜 1910년 이후에는 C 표기를 찾아보기 힘들고 K 표기 일색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영문 호칭 변경에 일제가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밝히는 것은 일본 측 관련문서가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가 지난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일제의 침략성 여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논의를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야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사실은 타자의 눈에 비친 한국 사회의 모습, 즉 한국 사회의 '타자인식'의 역사성과 관련된 사항이고, 또 동아시아 지식체계의 대표성을 어느 나라가 행사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불행하게도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체계를 대표한 것은 일본이었고, 그 잔영은 아직까지도 여러 방면에 남아 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 대표된 한반도의 명칭은 'Corea-Chosun'이 아니라 'Korea-Chosen'이었다.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노회찬 씨가 어느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이라크에 기어코 파병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논리에 대해 국제사회에는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놓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근대 이후 한국의 타자인식은 항상 일본, 미국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김선일 씨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이라크 파병문제가 여론의 초점이 되었지만 이 문제 역시 이라크-미국-한국이라는 3원 3차 방정식의 틀 속에 묶여 있다. 즉 근대이래 한국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이항관계가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또는 그 이상의 복수 국가들을 매개한 다자관계의 틀 속에 놓여 있고, 한국이 그 자체로 대표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남북 공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선일 씨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이라크 무장저항단체의 야만적 행위에 향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권국가라는 주장이 무색할 만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과 그 기저에 있는 의존적이고 굴종적인 대미외교 자세를 향해 분출되고 있다. 작년 평양 학술회의에서 이북 학자들과 이남 학자들이 함께 묘향산을 답사할 기회가 있었다. 묘향산 여행길에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젊은 연구자와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북미관계의 전망에 대한 그의 언급이다. 묘향산 등반 뒤 냇가에서 야외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북미관계의 장래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한숨을 쉬면서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어이 한번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북의 인민들은 기어코 한 번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의 대답에서 북의 주민들에게 전쟁은 이남 주민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쟁이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 물음에는 즉답을 회피한 채, 전쟁은 지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의 답변은 왜 북한 당국이 작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을 군인들과 민간인 퍼레이드 중심으로 구성했는지 알려준다. 그에게 Corea 지명 검색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지만 언제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젊은 학자가 손에 총대신 펜을 쥐고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
- BoardLang.text_prev_post
- 교수재임용제와 비정년트랙
- 2004.06.29
- BoardLang.text_next_post
- 한국사회의 변화와 2004년 총선
- 2004.06.16
